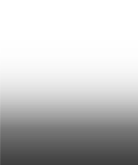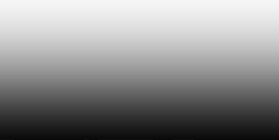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이는 17만 명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성인이 된 뒤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 한국에 정착하려 해도, 친부모와 입양 정보를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장동건 기자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지난 1981년 광주에서 태어난 44살 김아영 씨는 생후 7개월 만에 미국 뉴욕주의 한 가정에게 입양됐습니다.
평생을 미국인으로 살았지만, 현지에서 한국인들을 만난 뒤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고 결국 지난 4월 서울행을 택했습니다.
40살이 넘어 처음 배우는 한국어가 흥미롭지만, 매달 150만 원이 드는 생활비는 부담입니다.
▶ 인터뷰 : 김아영 / 미국 입양
- "혼자 집을 구했고 비용도 스스로 냈어요. 한국어를 잘할 수 있을지, 누구와 사귈 수 있을지, 직장을 구할 수 있을지 변수가 많아요."
꾸준히 교류할 수 있는 공동체와 친부모를 찾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인데,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사실상 없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생후 5개월이 채 안 돼 호주로 입양된 41살 이설희 씨도 6년 전 친부모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렵게 친모와 연락은 닿았지만, 출산 당시 미혼모였던 탓에 아는 건 친부의 이름과 나이뿐입니다.
▶ 인터뷰 : 이설희 / 호주 입양
- "경찰서에도 가봤지만, 친모한테 받은 정보가 전부라 친부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 스탠딩 : 장동건 / 기자
- "최근 6년간 해외 입양인의 출생정보와 친부모 정보 공개 청구 건수는 1만 1천여 건인데, 원하는 정보를 얻은 건 2천여 건 약 20%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제 친부모 상봉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5%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 인터뷰 : 노혜련 /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명예교수
- "친생부모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나머지 배경도 잘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우편을 통해 친부모의 정보 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전화 방식으로 개선하는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국내 정착을 원하는 해외 입양인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통합 기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뉴스 장동건입니다.[notactor@mk.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홍영민 VJ
영상편집 : 이주호
그 래 픽 : 백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