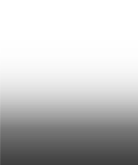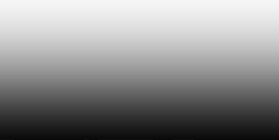“노력을 하면 인생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는다. 하지만, 실패를 거듭할 때마다 운명이 우리의 삶을 속박한다는 걸 깨닫고 좌절하곤 한다. 운명의 실체는 있을까. 이 책은 인간의 행복의 제1의 조건은 ‘유명한 도시에서 태어나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
| ↑ 『번영하는 도시, 몰락하는 도시』 이언 골딘, 톰 리-데블린 지음 / 김영선 옮김 / 어크로스 펴냄 |
저자들은 왜 어떤 도시는 거대해지고 어떤 도시는 소멸하는지, 도시화가 야기한 각종 문제에 세계의 도시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21세기 지식 경제 시대에 맞는 도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등 도시가 마주한 문제와 그 해결책을 역사적 사례와 풍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탐구한다.
책은 3,5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난다. 인류 초기의 도시 거주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로마제국은 도시의 인구는 15%를 채 넘지 못했다. 1800년대까지도 세계 인구 10억 명 가운데 도시 거주민은 7,000만 명에 불과했다. 오늘날, 세계 인구는 80억 명이 넘었고, 45억 명이 도시에 살고 있다. 이처럼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인류의 번영이 도시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류 최초의 도시가 등장한 이후, 도시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며 협력과 분업, 발명을 통해 진보를 이끌었다.
뉴욕과 상하이 등 현대의 메트로폴리스는 혁신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와 그 명성이 흔들리고 있다. 규모는 커지는데 거주민은 빈곤해지고,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가상공간은 사람들을 분열시킨다. 설상가상 전염병과 기후변화까지 도시를 위협한다. 세계의 도시들은 기로에 서 있다.
해답 또한 도시에서 나온다. 1970년대 초 실업률이 치솟으며 돌이킬 수 없는 쇠퇴기에 접어들었던 시애틀은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에 들게 된 전환점을 맞이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과 함께 성장하면서, 도시에 일자리에 늘어나고 활기를 띄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또한 도심에 밀집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교외에서도 같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젊은 지식 노동자들이 도심에서 누리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생활양식과 활기찬 커뮤니티를 교외에서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클라우딩 컴퓨팅,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의 지식 허브로 자리매김해 광역 경제권의 핵심으로 떠오른 ‘알링턴’(워싱턴디시 교외)이나, 문 닫은 쇼핑몰 부지를 복합용도로 개발해 다시 사람들을 끌어들인 ‘레이크우드’(덴버 교외)를 주목할 만한 예로 든다. 도심과 지역의 균형 잡힌 발전이야말로, 도시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마틴 울프 「파이낸셜타임스」 수석 칼럼니스트는 “도시가 직면한 도전과제와 모든 거주민을 위해 더 나은 도시를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매혹적인 책”이라고 이 책을 평하며 ‘2023년 파이낸셜타임스 올해의 책’에 선정했다.
 |
| ↑ 『종이 위의 직관주의자』 박찬휘 지음 / 싱긋 펴냄 |
저자 박찬휘는 페라리,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등 세계 굴지의 자동차 회사에서 활동한 20년 경력의 자동차 디자이너이다. 홍익대학교와 영국왕립예술대학원에서 디자인을 공부했고, 페라리의 디자인하우스로 알려진 피닌파리나를 시작으로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를 거쳐 현재는 뮌헨에 위치한 전기차 니오의 디자인센터 수석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첫 책 『딴생각』에서 상상력의 원천이었던 딴생각과 호기심을 통해 세상에 질문을 던졌던 그는 이번 두 번째 책에서는 직관적 사유의 중요함을 전제로 인간을 따르는 디자인과 나를 깨우고 세상을 바꾸는 손안의 힘에 대해 이야기한다. 디자이너가 되는 방법에 관해서 저자는 연필과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된다고 응원을 건넨다. 저자는 종이 위에서 자유롭게 노는 방식으로 누구나 직관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 안에 잠재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한다.
디자인의 본질과
[글 김슬기 기자 사진 각 출판사]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910호(23.12.26)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