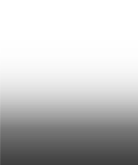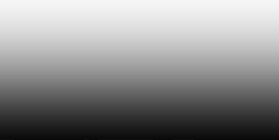국민의힘 후보에게 뒤진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 이재명 후보가 적잖이 충격을 받은듯하다.
이후보는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다가 곧바로 "ARS(여론조사)는 실제 결과와 잘 안맞는다"며 말을 바꿀만큼 당황한 기색이다.
그럴만도하다.
이 후보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이 어떤 지역인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내리 5선을 한 민주당 텃밭이다.
누가나와도 여유롭게 승리를 해야 하는곳이다.
그런데 민주당 대선후보까지 지낸 이 후보가 오차범위내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다니 한마디로 망신이다.
물론 계양을이 민주당 텃밭이라는 사실은 유효하기때문에 여전히 이 후보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는게 현실적이다.
다만 압승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는것만으로도 이후보의 자존심이 상할만 하다.
사실 대선패배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손 안대고 코푸는 지역에 나가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고 하는데 역풍이 불지 않는게 이상한 일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후보 등판을 밀어붙인건 국민정서를 잘못 읽었기때문이다. 한마디로 오판을 한것이다.
대선때 받은 1600만표라는 최면에 빠져 지지층 표가 결집될 것이라는 정신승리를 한게 되레 자충수가 됐다.
1표차로 지나 100만표 차이로 지나 국민은 정권재창출 대신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입법·행정·사법 그리고 지자체를 모두 장악한 상태에서 압도적 조직과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도 대선서 패한건 아깝게 진게 아니라 완패한것이다.
이 후보나 민주당이 대선때나 지금이나 말로만 사과·반성을 할뿐 바뀐게 하나도 없다는 점도 부정적 여론을 키우고 있다.
이후보는 대선때 대장동 개발특혜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더니 지금도 국민의힘에 덤터기를 씌우고 있다.
"진짜 도둑이 누구냐. 국민의힘에 '적반무치당(적반하장+후안무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려 한다"며 대장동 사태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겼다.
하지만 자신이 대장동 설계자이고 단군이래 최대치적사업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온게 바로 이후보다.
사업 최종결재도 모두 본인이 하지 않았나.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태 몸통이라면 단군이래 최대치적사업이 국민의힘 덕분이라는건가.
아니면 자신이 설계한 사업이지만 국민의힘에 놀아났다는건가. 그렇다면 감독책임을 못한 무능을 스스로 실토하는것이나 마찬가지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후 발언도 그렇다.
모처럼 여야가 함께 참여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화해와 통합의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에 대고 "국민의힘은 학살의 후예"라며 저주하는건 또 뭔가.
실체조차 없는 민영화 괴담으로 공격에 나섰다가 되레 제2의 광우병, 제2의 생태탕 되치기도 당했다.
욕설을 한 시민이 잘못한것은 사실이지만 굳이 쫓아가 범죄 운운하는것도 부적절하다.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 화가나면 언제든 선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오해와 억측만 자초했다.
민주당도 급할땐 반성한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 달라는 읍소전략만 반복할뿐 바뀐게 없다.
대선을 앞두고 윤미향·이상직 제명을 약속했지만 후속조치는 나몰라라 했다.
윤미향은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를 고발하는 등 여전히 국회의원 위세를 떨치고 있다.
86 용퇴를 이야기하더니 되레 송영길은 서울시장 후보로, 윤호중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거를 이끌고 있다
검찰독재·검찰공화국 독주를 막기위해서라도 민주당에 표를 달라는건 한마디로 코미디다.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검찰독재 공포를 선동하는것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자신들의 입법폭주부터 사과하는게 순서다.
잡으라는 고위공직자 부패와 거악은 잡지도 못한채 민간인 통신사찰이나하는 공수처법, 전세지옥을 초래한 임대차3법을 날치기 통과시킨게 민주당이다.
최근엔 권력자에 대한 검찰수사권을 뺏어버린 검소완박을 여론의 거센반대에도 밀어붙였다.
1년전에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한 법사위원장직도 못넘겨주겠다며 '배째라'식으로 나오고 있다.
이처럼 한입으로 두말을 하는 당의 반성과 사과를 어떻게 국민들이 신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줄 알았냐"며 국민과 언론을 조롱했던 사람이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다.
이러니 '사과한다고 했더니 실제로 사과한지 알더라, 반성한다고 했더니 정말 반성하는줄 알더라'라는 말이 나오지 말란 법이 있겠나.
[박봉권 논설위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