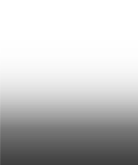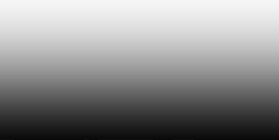|
| ↑ 6월부터 폭염이 찾아온 대구 (연합뉴스) |
포럼에선 전문가 8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문가에게 어떤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지 질문했습니다. 후보는 다양했습니다. 화재와 산불, 댐 사고와 감염병, 미세먼지, 원자력 사고 등 여러 재난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가운데 당당히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재난은 바로 ‘가뭄·한파·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였습니다. 84%의 전문가가 극한의 가뭄과 한파, 폭염이 찾아와 재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어떤 재난 대응에 가장 많은 힘을 쓸 것으로 보이는지 묻자 ‘가뭄·한파·폭염’ 재난을 막기 위해 가장 많은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
| ↑ 37도를 넘어선 고양시 (MBN) |
우리는 이미 날씨가 얼마나 달라졌고, 힘들게 하고 있는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6월 날씨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역대급’이었습니다. 6월 전국 평균기온은 22.7도로 평년 21.4도보다 무려 1.3도나 높았습니다. 1973년 우리나라는 기상관측망을 전국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관측이 시작된 시기인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관측한 기록 가운데 가장 높은 온도였습니다. 기상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강한 햇볕이 내리쬈고, 중국에서 데워진 공기가 서풍을 타고 유입되며 기온을 더 높였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도 6월 19일 고양시로 더위를 취재하러 갔습니다. 이날 고양시의 낮 최고 온도는 3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잠시만 서 있어도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맑은 날이면 인파로 북적였던 호수공원을 찾았습니다. 마치 오늘은 공원에 가지 말자고 약속한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산한 공원에서 한참 동안 기다리다 만난 중년 남성은 “원래 양산을 쓰지 않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썼다”며 “날씨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
| ↑ 2018년~2024년 평균 최고기온과 폭염일수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
저에게 가장 더웠던 해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주저하지 않고 2018년을 꼽습니다. 막내 기자였던 시절, 낮에는 찜통더위를, 밤에는 열대야를 취재하며 땀을 줄줄 흘렸던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있습니다. 기록을 살펴봐도 2018년 여름은 무서울 정도로 더웠습니다. 8월 1일 홍천의 최고기온이 41도를 기록하며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을 것 같은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서울도 39.6도까지 올랐습니다.
최고기온이 33도를 넘는 날을 의미하는 폭염일도 가장 많았습니다. 2018년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31일로 1973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평균 폭염일수가 14일인 것과 비교하면 더운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더위 성적은 2018년을 이겼습니다. 올해 6월 폭염일수는 2.8일이었습니다. 평년 6월 폭염일수는 0.7일로 하루 있을까 말까 한 정도였는데, 올해는 3일 가까이 됐던 겁니다. 악명 높은 2018년도 1.5일에 그쳤습니다.
물론 6월이 기록적으로 더웠다고 7월과 8월 역시 2018년보다 더 더울 것이라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기온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서운 예고편을 본 우리의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
| ↑ 성지순례 기간에 폭염이 덮친 사우디아라비아 (연합뉴스) |
국제개발환경연구소(IIED)가 세계 주요 대도시의 35도가 넘는 날의 빈도를 조사했습니다. 서울도 조사 대상 중 하나였죠.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 35도가 넘는 날은 9일이었습니다. 2004년부터 2013년까지는 1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23년까지는 무려 58일이었습니다. 35도를 넘는 극한 폭염이 9일에서 58일로 500% 넘게 늘어난 겁니다. 우리 세대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더위와 맞서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낮 최고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며 온열질환으로 1,30
조금은 더 서서히 다가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재난급 폭염은 성큼성큼 걸어와 어느새 우리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괴물과 맞설 수 있을까요?
[ 강세현 기자 / accent@mbn.co.kr ]